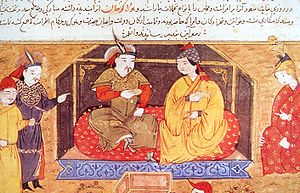향기마을
중국의 역사 60 (몽골 제국 3 : 일 한국, 킵작 한국) 본문
중국의 역사 60 (몽골 제국 3 : 일 한국, 킵작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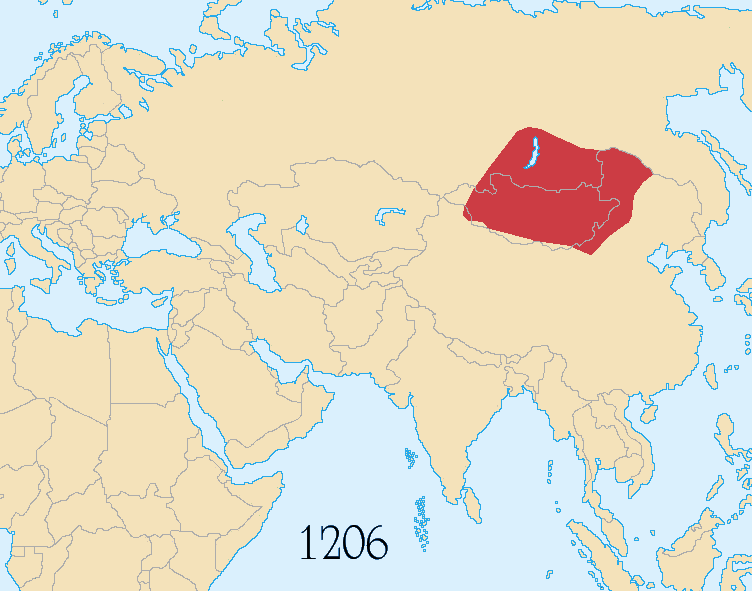
일 한국
 | |
| 일한국의 영토(1256년-1353년) | |
| 공용어 | 몽골어,페르시아어 |
| 수도 | 마라게, 타브리즈, 솔타니예 |
| 정치체제 | 전제군주제 |
| 종교 | 불교에서 이슬람교로 변함 |
| 성립 | 1256년 |
| 해체 | 1335년 |
| 초대 칸 | 훌라구 칸 1217년-1265년 |
| 최후 칸 | 아부 사이드 1305년 -1335년 |
| 성립 이전 | 아바스 왕조 |
| 해체 이후 | 자라이르 왕조 츄판 왕조 |
일 한국( - 汗國 )은 몽골 제국의 사한국 중 하나로 현재의 이란, 이라크에 걸쳐 있던 나라이다. 칭기즈 칸의 손자이자 툴루이의 아들인 훌라구 칸이 중동 원정을 통해 1255년에 건설한 이후 이슬람화하여 약 1세기 가량 존속했다. 페르시아 칸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시리아의 영토를 두고 대립했으나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는 못했다. 1335년 9대 칸인 아부사이드 칸 사후 사실상 멸망하여 자라이르 왕조, 츄판 왕조 등 여러 왕조로 갈라졌다.
훌라구와 중동원정
오고타이계의 칸과의 경쟁을 통해 왕위에 오른 툴루이의 아들 몽케 칸은 자신의 동생인 훌라구(혹은 훌레구)에게 중동 원정을 명한다. 이 때가 바로 1255년으로 궁극적 목적은 아랍 이슬람권의 중심지인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훌라구는 1255년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고 암살로 유명한 과격한 이슬람 집단 이스마일파의 일파인 아사신을 괴멸시켰다. 2년 뒤인 1257년 11월 훌라구의 군대는 마침내 바그다드에 도착하여 성을 포위했다. 바그다드는 끝까지 버텼으나 결국 1258년 2월 10일에 항복하고 말았고 마지막 칼리파 알 무스타심은 살해당했다. 바그다드를 정복한 몽골 군은 도시를 약탈하고 무슬림을 학살했다. 이로써 압바스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
바그다드를 정복한 훌라구 칸은 시리아 지역으로 원정을 나섰다. 당시 시리아 해안 지역에는 십자군이 세운 기독교 국가들이 남아있었다. 십자군이 세운 공국 중 하나인 안티오키아 공국의 보에몽 6세는 지금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칠 기회라고 판단하여 몽골 군에 합류했다. 1260년 훌라구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파죽지세의 기세로 알레포를 점령하고 시리아의 여러 군소정권을 복속시켰다. 하지만 1260년 봄, 몽케 칸의 사망과 그 뒤로 이어진 내분 때문에 훌라구는 그 곳에서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훌라구는 시리아를 떠나며 자신의 군대를 장군 키트부카에게 맡겼다. 키트부카는 훌라구의 군대를 이어받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시리아 지역의 아이유브 술탄 안나시르 유수프를 처리하여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했다.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한 키트부카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에 항복 권고를 보냈으나 당시 맘루크 왕조의 술탄인 쿠투즈는 이를 거부하고 바이바르스와 연합하여 키트부카와 맞섰다. 마침내 몽골 군과 맘루크 왕조 군은 아인잘루트에서 크게 격돌했는데 이 전투에서 몽골 군은 대패하여 총사령관인 키트부카까지 전사하였다. (아인잘루트 전투, 1260)
아인잘루트 전투의 패배 이후 전황은 결정적으로 바뀌어 몽골군은 시리아를 내주고 티그리스 강 이북으로 북상하였으며 아인잘루트 전투 승리의 주역인 바이바르스는 경쟁자인 쿠투즈를 제거하고 맘루크 왕조의 유일한 권력자로 집권했다. 이후 일 한국과 맘루크 왕조의 국경선은 티그리스 강으로 결정되었으며 약 100여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훌라구의 중동 원정이 끝난 뒤, 훌라구가 중동 원정 과정에서 행한 이슬람 교도 학살이 문제가 되어 이슬람교로 개종한 킵차크 한국의 칸 베르케와 훌라구 간에 베르케-훌라구 전쟁(Berke-Hulagu War)이라고 불리는 전면전이 발발했으며, 이 전쟁은 이후 몽골 제국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역대 칸
- 훌라구(1256년 ~ 1265년)
- 아바카(1265년 ~ 1282년)
- 테쿠데르(1282년 ~ 1284년)
- 아르군 칸(1284년 ~ 1291년)
- 가이하투(1291년 ~ 1295년)
- 바이두(1295년)
- 가잔 (1295년 ~ 1304년)
- 울제이투(1304년 ~ 1316년)
- 아부 사이드(1316년 ~ 1335년)
- 아르파 케운(1335년 ~ 1336년)
아르파 케운 사망 이후 칸
- 무사(1336년 ~ 1337년) - 바그다드의 알리 파드샤의 명목상 칸
- 무함마드(1336년 ~ 1338년) - 자라이르 왕조의 명목상 칸
- 사티 벡(1338년 ~ 1339년) - 추판 왕조의 명목상 칸
- 슐레이만(1338년 ~ 1353년) - 추판 왕조의 명목상 칸
- 자한 테무르(1338년 ~ 1340년) - 자라이르 왕조의 명목상 칸
- 아누시라완(1343년 ~ 1356년) - 추판 왕조의 명목상 칸
- 가잔 2세(1356년 ~ 1357년) - 동전에만 이름이 나와 있는 칸, 실존 여부 불명확
훌라구 칸(1217년 – 1265년 2월 8일)은 몽골의 통치자로 서남 아시아를 정복한 정복자이다. 훌라구, 훌레구 등으로도 불린다. 칭기스 칸의 손자이며 몽케 칸, 쿠빌라이 칸의 형제이다.
훌라구의 군대는 서쪽으로 정복활동을 벌여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일 한국을 세웠다. 그의 치세에 당시 이슬람의 가장 큰 세 도시중 2개인 바그다드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정복당했고 남은 하나인 이집트의 카이로는 그의 침공으로 맘루크 왕조로의 권력이동이 있었다.
훌라구는 징기스 칸의 아들중의 하나인 톨루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인 소르칵타니였다.
1251년 몽케 칸이 몽골족의 대칸으로 임명되었고 1255년 훌라구는 몽케의 명을 받들어 대군을 이끌고 서남 아시아의 이슬람국가들에 대한 정복에 나섰다. 그는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 알 무스타심에게 몽골족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는데 아바스 칼리파가 거부했다. 그는 수십만의 몽골군을 이끌고 바그다드로 진격하여 1256년 12월 알라무트의 아사신 근거지를 파괴하고 거침없이 바그다드로 쳐들어갔다.
바그다드를 포위하자 칼리파 알 무스타심은 자비를 구했으나 소용없었다. 1258년 2월 10일 훌라구는 이슬람군의 항복을 받았고 이슬람군이 무장해제함과 동시에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여 거의 8만명의 바그다드 이슬람교도가 학살당했고 칼리파 알 무스타심 역시 죽임을 당했다. 이로서 압바스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
훌라구는 계속 서쪽으로 진격하였고 여러 기독교 군주들을 자신의 가신으로 세웠다. 안티오키아의 보에몽 4세, 아르메니아의 하이톤등 기독교군과 합세하여 1260년 시리아를 침공했다. 먼저 알레포가 정복도었고 곧이어 다마스쿠스를 공격하여 3월 1일 다마스쿠스도 함락당했다. 당시 기독교도들은 훌라구의 몽골군이 이슬람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훌라구의 대장 키트부카는 기독교도였다.
시리아의 정복을 끝낸 뒤 훌라구는 이집트로 진격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1259년 말, 몽골의 대칸 몽케 칸이 죽자 훌라구는 카라코룸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키트부카에게 소수의 몽골기병을 남기고 철수하였다. 그 해 9월 키트부카와 기독교 제후들의 연합군과 이집트 맘루크군이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맞붙었다. 이 전투는 맘루크의 승리로 끝나고 키트부카는 전사하였다. 이로서 몽골군의 서진은 저지되었고 이집트의 정권은 바이바르스에게 넘어갔다. 일한국과 이슬람 의 국경은 티그리스 강으로 결정되었다.
훌라구는 쿠빌라이를 다음 대칸으로 인정하고 1262년 일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킵차크 한국의 베르케 칸과 전투를 벌였는데 베르케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칸으로 훌라구의 바그다드 함락에 대한 복수를 벼르고 있었다. 이는 몽골족 간에 벌어진 첫번째 전면전으로 몽골 제국의 분열의 시초가 되었다.
훌라구는 1265년 죽었고 아들 아바카 칸이 그의 뒤를 이었다.
아인잘루트 전투
| 아인잘루트 전투 (몽골 원정의 일부) | |||
| |||
| |||
| |||
| 교전국 | |||
| 맘루크 왕조 | 몽골 제국 | ||
| 지휘관 | |||
| 사이프 아딘 쿠투즈 바이바르스 |
키트부가 | ||
| 병력 | |||
| 약 20,000~30,000명 | 약 10,000~20,000명 | ||
아인잘루트 전투(영어:Battle of Ain Jalut)는 1260년 9월 3일 현재는 웨스트 뱅크라 불리는 지방의 북부인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제즈리엘 계곡에서 쿠투즈가 이끄는 이집트계 맘루크 왕조군이 키트부카가 이끄는 시리아 주둔 몽골 제국군 및 크리스트교도 제후연합군을 격파한 전투이다.
이 전투는 많은 역사가들로부터 거시 역사학적 측면에서 몽골군의 정복이 공세종말점에 이른 것을 나타내는 아주 큰 중요성을 지니는 사건으로 여겨진다. 아인잘루트의 전투는 몽골군이 겪은 최초의 결정적인 패배였다. 몽골군은 비록 전에 패배를 겪었더라도 언제나 되돌아와 패배를 설욕하였다. 그러나 아인잘루트의 전투는 몽골인들이 복수에 실패한 최초의 전투이다. 몽골 일칸국의 제왕, 훌라구칸은 다시는 이집트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가 페르시아에 건설한 칸국은 오직 맘루크들을 단 한번 격파하기만 했을 뿐 1300년의 몇 개월간 이외에는 팔레스타인의 일부분과 시리아를 재점유하지 못했다.
배경
몽케칸이 1251년 몽골의 대칸으로 즉위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세계제국을 위한 그의 할아버지 징기스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착수했다. 서방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몽케칸은 그의 동생이자, 또다른 칭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 칸을 선택했다.
군대를 모집하는 데 5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훌라구 칸이 1256년까지는 정복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페르시아의 몽골 본영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지자, 홀라구는 남진했다. 몽케칸은 저항없이 항복하는 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저항하는 자는 철저히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홀라구와 그의 군대는 자신들의 길을 가면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왕조들을 점령하였다. 몽골군의 진로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몽골에게 통치권을 양도하고 몽골군의 일부로 합류하였다.
원정군은 유목지역으로 가장 최적지였던 아제르바이잔 방면으로 진격하던 중 1260년 시리아 북부로 침공하여 알레포을 점령했다. 몽골군에게는 십자군이 시리아 북부에 세웠던 크리스트교도의 여러 정권 및 키리키아-아르메니아 왕국, 거기에 쟈지라-아나톨리아 방면의 이슬람교도의 여러 정권이 복속하였다.
몽골군이 바그다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군대는 실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심지어 안티오크 공국에서 항복한 프랑크 인의 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르시아에 있는 하쉬샤신이 함락되자, 500년된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프 왕조는 파괴되었다.(1258년 바그다드의 전투)그리고 아이유부 왕조의 다마스쿠스 역시 함락되었다. 훌라구의 계획은 팔레스타인을 통해 이집트로 향해 남진을 하여 마지막 남은 이슬람 정권인 맘루크 왕조와 대치하는 것이었다.
이집트에 온 몽골사신
1260년 훌라구는 카이로의 쿠투즈에게 항복을 권하는 사자를 보낸다.
그러나 쿠투즈는 사자를 살해하고, 그들의 머리를 카이로의 문 중 하나인 밥 주웨일라에 효시하였다.
힘의 동력이 몽골 제국에서 일어난 내부의 상황으로 인해 변화했다. 몽케 대칸이 죽었다. 그리고 홀라구와 다른 몽골인들은 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대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홀라구는 자신의 군대의 대부분을 그와 함께 몽골로 향했고, 그의 휘하의 뛰어난 장수이자 투르크족이며 기독교인인 키부카 노얀에게 겨우 하나, 혹은 두개의 만인대(1만에서 2만)정도 되는 훨씬 적은 숫자의 병사만을 남겼다. 키부카의 군대는 시리아의 적항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을 지나 남진하였다.
맘루크의 술탄 쿠투즈는 이때 휘하의 맘루크이며 몽골의 다마스쿠스와 시암의 대부분 지역이 함락된 이후 이슬람을 이들로부터 지키기를 원했던 바이바르스와 동맹을 맺었다.
이때, 몽골군측은 아크레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십자군 예루살렘 왕국의 잔당들과 함께 프랑크-몽골 동맹(적어도, 종속 요구)을 맺으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교황 알렉산데르 4세는 이를 금하고 시돈의 율리안은 키부카의 손자중 하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저질렀다. 분노한 키부카는 시돈을 약탈했다. 아크레의 남작들은, 비록 그들이 맘루크를 적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몽골을 더욱 큰 위협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십자군은 두 세력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했다. 이례적으로, 십자군 세력은 이집트 맘루크들이 그들의 영토를 통해 북쪽으로 저항없이 진군하고, 아크레의 근처에서 재보급하여 야영하는 것에 동의했다. 쿠투즈는 상대적으로 적은 키부카 휘하의 몽골군 보다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양군은 갈릴래아에서 격돌했다.
전투
맘루크와 몽골군은 1260년 6월 성지에 진을 쳤다. 맘루크의 화물은 몽골군의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투르크, 체르케스 계 종족의 민족으로 이집트의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구입한 이들이었고, 이들은 나일강에 있는 섬에 위치한 맘루크의 사령부에서 훈련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위대한 기병일 뿐만 아니라 몽골의 전략과 무기와 같은 스텝의 전술에도 친숙했다. 이후, 이집트는 특히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그들은 9월 3일 아인 잘루트에서 만났고, 양군의 군대는 약 2만정도 되었다. 맘루크는 거짓 퇴각으로 몽골군 기병을 격파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세가 몽골의 야만적인 공격에 의해 압도되었다. 쿠투즈는 전력의 보존을 위해 근처 계곡에 숨어있던 기병들과 함께 성공적인 반격을 이끌도록 자신의 군대를 독려하였다. 몽골군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키부카는 체포되어 살형당했다. 맘루크의 중무장기병은 누구도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접근전에서 몽골군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과업에 성공하였다.
아인 잘루트의 전투는 폭발하는 대포(아라비아 어로 모이드파)가 사용된 최초의 전투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폭발하는 대포는 몽골의 말과 기병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몽골군의 부대를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맘루크의 이집트 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 대포의 폭발성 화약 구성은 후에 14세기 아라비아 군사 요람에서 묘사되었다.
영향
아인 잘루트의 승리 후에 카이로로 돌아오는 도중, 바이발스는 사냥여행 도중 쿠투즈를 배신하고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 스스로 술탄이 되었다. 그의 후계자는 1291년 팔레스타인의 최후의 십자군 국가를 멸망시켰다. 몽골군은 아인 잘루트 전투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제1차 홈스의 전투에서 또다시 패했고, 시리아로부터 완벽하게 추방되었다.
내부에서 벌어진 분란은 훌라구 칸으로 하여금 아인 잘루트의 치명적인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서 맘루크에 대하여 자신의 전군을 동원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러시아에 있는 킵차크 칸국의 칸 베르케 칸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그의 사촌이 이슬람의 정신적 맹주인 아바스 칼리프를 파괴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보았다. 무슬림 역사가 라시드 앗 딘은 베르케가 바그다드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몽케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당시 베르케는 몽케가 중국에서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무슬림의 모든 도시들을 약탈하고 칼리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나는 그가 너무 많은 고귀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불렀습니다." 맘루크는 무슬림이며, 그의 사촌과 친하지 않은 베르케라는 스파이를 통해 정보를 얻음으로써, 신중하게 그들의 나라를 훌라구와 그의 칸국으로부터 보호했다.
쿠빌라이를 최후의 대칸으로 선정함으로써, 몽골의 왕위 계승이 최종적으로 끝난 후, 훌라구는 1262년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아인 잘루트에서 복수를 하기 위해 맘루크를 공격했다. 그러나 베르케 칸은 홀라구에 대항하여 성지에서 북방에 이르는 그의 영지에 대하여 급습을 시작했다. 훌라구는 1263년 카프카스 산맥의 북부 침략을 시도했다가, 몇 번의 패배를 겪게 되었다. 이는 몽골인들간의 최초의 내전이었고, 통합된 제국의 최후를 알리는 상징이었다.
훌라구는 아인 잘루트 이후에 맘루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약 2개 만인대에 해당되는 소수의 군대를 보낼 수 있을 뿐이었다. 훌라구 칸은 1265년 사망했고, 그의 후계자이자 아들 아바카는 자신의 왕조를 설립했다.
훌라구 이후의 다른 칸들은 무슬림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많은 전투를 벌였다. 1303년 맘루크는 몽골인과 최후의 싸움을 벌였거, 그들은 샤크하브의 전투에서 그들을 패퇴시켰다. 맘루크 술탄왕조는 엄격한 셀림의 대까지 약 250년 간 중동을 지배했고, 오스만 제국이 그들의 독립된 왕조를 멸망시켰다. 베르케 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모스크바의 대공이 1480년 우그라 강의 대첩에서 그들의 왕국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때까지 220년간 러시아를 지배했다. 가장 짧은 기간을 영위한 왕조는 훌라구 칸의 왕조였다. 그의 왕조는 서남아시아를 겨우 91년간 다스렸을 뿐이다. 홀라구에 의해 세워진 일칸국은 1353년 멸망했다.
전투 후 상황 및 후세에 남겨진 영향
아인잘루트 전투 후, 맘루크 왕조군은 시리아를 북상하여 몽골군의 잔당 및 시리아에 재침입한 부대를 격파하는 것을 계속해 시리아 거의 전역을 평정했다. 그러나 알레포을 회복할 때쯤 이번 전투의 공로자였던 바이바르스와 총사령관 쿠투즈의 대립이 재연되었다. 바이바르스는 알레포의 총독에 임명되어 이 지방에서 자립할 야망을 갖고 있었으나, 쿠투즈는 바이바르스가 독립하여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해 이것을 거부했다.
그 때문에 카이로로 돌아도는 도중에 바이바르스에 의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쿠투즈는 살해되고 바이바르스가 새로운 맘루크 왕조의 술탄이 되었다.
바이바르스는 몽골의 침공을 막아낸 영웅으로서 카이로에 개선하여 이집트,시리아의 왕으로써 확고한 지위를 쌓았다. 그 후에도 매년 벌어진 몽골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바이바르스는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약소자들이었던 맘루크들을 안정한 정권의 주인으로 상승시키는 데 성공해, 사실상 맘루크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
한편 아인잘루트 전투 이전에 귀환했던 몽골제국의 훌라구는 아제르바이잔의 타브리즈에 이르러, 둘째형 쿠빌라이와 동생 아리쿠브케가 칸의 지위를 놓고 내분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는 이 땅에 머물기로 하고, 이란-이라크를 세력권으로 삼아 자립하였다. 이때부터 훌라구의 자손에 의한 세습이 이루어지게된 이란에 위치한 몽골정권을 일한국이라 부르게 되었다.
아인잘루트 전투의 결과 시리아는 맘루크 왕조의 영역이 되었고, 그 후에도 일 한국 왕조와 맘루크 왕조 사이에 이 지방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양국의 각축전은 킵차크 한국(주치 우르스) 및 비잔틴 제국, 서유럽 여러나라을 포함시키게 되어, 13세기 후반을 통틀어 가장 치열한 외교전으로까지 번질 정도였다.
이 전투는 맘루크 왕조측의 역사가들이 남긴 동시대 아라비아어사료에서 현대 역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무슬림이 몽골제국군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처음으로 이들을 격파한 전투로써 매우 명성이 높다. 그러나 무슬림 정권의 군대가 몽골제국군에게 승리를 거둔 전례는 이미 1221년 호라즘샤 왕조의 잘랄 웃딘의 군단이 시기 쿠토쿠 가 이끄는 3만기병을 격파한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전투가 있어,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은 아니었다.
한편 집사(集史) 등 몽골제국 측의 페르시아어 사료에서는 전초전(前哨戦)이 아닌 국지전(局地戦) 취급을 받고 있었다. 몽골측 입장에선 이 전투에 참가했던 몽골제국군은 훌라구의 귀환으로 인해 시리아에 남아있던 주력군의 일부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기타 몽골제국군이 패배한 전투는 후일 몽골측에게 반격을 받아 패주하거나 괴멸당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인잘루트 전투는 다른것에 비해 인상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아인잘루트 전투가 인상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그 후 몽골측의 정정(政情)이 놀랍도록 변화하여 시리아 탈환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맘루크 왕조 통치하에 있게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되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 일 한국 왕조는 1260년 이후 훌라구, 아바카 등은 킵차크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차가타이 한국과는 호라산 지역의 국경지역 분쟁에 신경을 썼기에 바이바르스가 지배하던 시리아 국경지역 침공에는 후속대책만이 되풀이 되었다.
역대 군주들 중에도 가잔 칸만이 시리아 지역에 여러차례 원정군을 파견하였으나, 대부분 군의 규모도 많아야 3만전후에 불과해 알레포 이남지역에 대한 정복엔 실패하였다. 쿠빌라이와 아리쿠브케의 제위계승분쟁 후에도 몽골제국 자체, 왕가간의 분쟁이 장기화가 계속되어 제국전체에 의한 군사행동이 불가능하게 된것도, 몽골측에 있어 시리아에 있던 잃어버린 영토 탈환의 기회가 사라지게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더 넓게 본다면 서방에게 있어 몽골제국의 끊임없는 확대가 정지된것이 아인잘루트 전투가 있던 1260년때 인것이 확인되고 있어 그 의미로써 매우 상징적인 전투라 할 수 있다.
아바카 칸(Abaqa Khan, 1234년 ~ 1282년)은 일 한국의 제 2대 칸(재위 : 1265년 - 1282년)이다. 훌라구 칸과 예순킨 하툰의 아들이다. 계모는 도쿠즈 하툰이다. 그는 형제 테쿠데르 칸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아바카의 치세는 몽골 제국 내의 내전으로 메워졌다.
아바카는 시리아의 홈스에 침입을 2차 시도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사실 일 한국 왕조는 1260년 이후 훌라구, 아바카 등은 킵차크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차가타이 한국과는 호라산 지역의 국경지역 분쟁에 신경을 썼기에 바이바르스가 지배하던 시리아 국경지역 침공에는 후속 대책만이 되풀이되었다.
쿠빌라이와 아리쿠브케의 제위계승분쟁 후에도 몽골제국 자체, 왕가간의 분쟁이 장기화가 계속되어 제국 전체에 의한 군사행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도, 몽골 측에 있어 시리아에 있던 잃어버린 영토 탈환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더 넓게 본다면 서방에게 있어 몽골제국의 끊임없는 확대가 정지된 것이 아인잘루트 전투가 있던 1260년때인 것이 확인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상징적인 전투라 할 수 있다.
훌라구는 1265년 죽었고 아들 아바카 칸이 그의 뒤를 이었다.
바락과 카이두의 강화는 체결되었지만 바락은 이 강화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부하라를 재정복하려 했으며 사마르칸트를 약탈하려고도 했다. 카이두는 바락의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여 바락에게 아바카가 다스리고 있는 일 한국을 공격할 것을 종용했다.
바락은 이 제의에 쉽게 응하여 일 한국을 공격할 준비에 나섰다. 이에 카이두는 자신의 아들인 차파르가 이끄는 군대를 지원했으며 킵차크 한국 역시 군대를 지원했다. 킵차크 칸국과 카이두의 지원을 받은 바락은 아바카 휘하의 장수인 테구데르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한 뒤 군대를 일으켜 호라산에서 일 칸국의 군대를 격파했다.
하지만 킵차크 칸국과 카이두는 바락의 성공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 때문에 킵차크 한국 군대는 바락 휘하의 장군인 자라일타이(Jalayirtai)와의 언쟁을 구실삼아 군대를 퇴각시켰다. 바락은 자라일타이를 보내 킵차크 한국 군대에 용서를 구하고 복귀할 것을 설득했지만 허사였다. 킵차크 한국의 군대가 떠나자 카이두가 보낸 차파르 역시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본국으로 도망가버렸다.
차파르가 도망오자 카이두는 아예 바락과의 관계를 끊고 아바카와 우호관계를 맺었다. 설상가상으로 1270년, 바락의 군대는 아바카와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했고 바락은 부상을 입었다.
킵자크 한국
킵차크 한국( 金帳汗國, 금장한국)은 러시아 남부와 동유럽에 성립한 몽골계의 한국이다. 사한국 중 하나로 바투가 세웠다. 바투는 징키즈 칸의 장남 쥬치의 아들이다.
1227년 8월 18일 칭기스 칸이 죽은 뒤, 혈통 문제가 불거져 나와 바투와 다른 칭기스 칸의 손자들 간의 알력다툼으로 나타난다. 우구데이는 쥬치의 혈통 문제를 거론하며 바투를 모욕한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사촌들에게 모욕을 당한 바투는 킵차크 한국을 건설하고 몽골 본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끊어버린다.
킵차크 한국의 바투의 서양 원정 이후,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킵차크 한국을 '황금의 약탈자'라는 뜻의 골든 호르드(Golden Horde)라고 불렀다.
킵차크 한국에 의해서 키예프 루시가 멸망될 때, 몽골군은 1239년에 이 타만 반도를 점령했다.
전성기
제3대의 베르케 칸에서 제9대 우즈베크 칸까지가 번성기였다.
알루구의 공격을 받은 카이두는 킵차크 칸국의 베르케의 지원을 받아 차가타이 칸국의 영토로 침입하여 알루구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다음 번 전투에서 반격을 당해 본국으로 철수했다.
차가타이의 칸이 바락으로 교체되자 카이두는 다시 원정에 나섰다. 카이두는 킵차크 칸국의 만그 티무르의 지원을 받아 차가타이 칸국을 침입하여 시르다라강 근처와 코잔드에서 벌어진 두 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바락은 트란속시아나로 도망친 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약탈하여 군대를 다시 모았다.
바락의 격렬한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자 카이두는 배후의 쿠빌라이가 침입해올 것을 염려해 바락과 강화를 체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강화의 결과 카이두와 만그 티무르가 트란속시아나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으며 카이두는 차가타이 칸국이 소유하고 있던 투르키스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카이두는 강화대로 이 땅을 만그 티무르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영토로 병합시켰다.
강화는 체결되었지만 바락은 이 강화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부하라를 재정복하려 했으며 사마르칸트를 약탈하려고도 했다. 카이두는 바락의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여 바락에게 아바카가 다스리고 있는 일 한국을 공격할 것을 종용했다.
바락은 일 한국을 공격하라는 제의에 쉽게 응하여 일 한국을 공격할 준비에 나섰다. 이에 카이두는 자신의 아들인 차파르가 이끄는 군대를 지원했으며 킵차크 한국 역시 군대를 지원했다. 킵차크 칸국과 카이두의 지원을 받은 바락은 아바카 휘하의 장수인 테구데르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한 뒤 군대를 일으켜 호라산에서 일 칸국의 군대를 격파했다.
하지만 킵차크 칸국과 카이두는 바락의 성공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 때문에 킵차크 한국 군대는 바락 휘하의 장군인 자라일타이(Jalayirtai)와의 언쟁을 구실삼아 군대를 퇴각시켰다. 바락은 자라일타이를 보내 킵차크 한국 군대에 용서를 구하고 복귀할 것을 설득했지만 허사였다. 킵차크 한국의 군대가 떠나자 카이두가 보낸 차파르 역시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본국으로 도망가버렸다
일 한국의 츄판 왕조는 1357년에 킵차크 한국의 10대 자니 벡 칸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했고 마렉 아시라프는 킵차크 한국군에 잡혀 처형당했다.
추판 조의 영토를 정복한 킵차크 한국은 통치의 어려움을 직감하고 1년 뒤인 1358년에 최종적으로 철수했으며 이 땅은 2년 뒤인 1360년에 자라이르 왕조의 우웨이스 1세의 손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마렉 아시라프의 아들인 티무르타스(Temurtas)도 사망하여 이후 추판 왕조의 존재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킵차크 한국은 기존 러시아 지배자들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간접 통치하였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측의 반격도 간헐적으로 있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 시절인 1380년 쿨리코보의 전투에서 러시아는 처음으로 몽골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후 몽골의 반격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1세기 뒤에 이루어졌다.
쇠퇴와 멸망
14세기 말부터 1440년대에 킵차크 한국이 분열하고, 성립한 한국 크림 한국, 아스트라한 한국, 카잔 한국, 시비르 한국으로 나뉘어져서 멸망했다.
킵차크 한국의 왕
- 1대 바투 칸(Батый) (1237-1256)
- 2대 사르타크 (1255-1256)
- 3대 베르케 칸(Берке) (1257-1266)
- 4대 멩구티무르 칸(Менгу-Тимур) (1266—82) (크림 한국을 지배함)
- 5대 투다멩구 칸(Туда-Менгу) (1282—87)
- 6대 탈라부가 칸(Талабуга) (1287—91)
- 7대~8대 토흐타 칸(Тохта) (1291—1312)
- 9대 우즈베크 칸(Узбек) (1312—42)
- 10대 자니베크 칸(Джанибек) (1342—57) (1356년에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을 지배함)
- 11대 베르디베크 칸(Бердибек) (1357-1361)
- 12대 마마이 칸(Мамай) (1362-1380)
- 13대 토크타미시 칸(Тохтамыш) (1380-1395)
- 테무르 콰틀루크 (1395년~1399년?)
- 셰이드 마흐메드 (1433년? ~ ?)
- 마흐무드 (1459년~1465년)
- 아흐메트 (1465년~1481년)
- 쉬야크 아흐마드 (1481년~1498년, 1499년~1502년)
- 무르타다 (1498년~1499년)
바투 칸
터키의 Söğüt에 있는 바투의 흉상
바투(1205년 ~ 1255년)는 몽골제국 킵차크 한국의 칸(재위:1242년~1255년)으로 칭기즈 칸의 손자이며 쥬치 칸의 둘째 아들이다. 쥬치의 아들들 가운데 훌륭한 임금이란 뜻의 바투가 아버지의 속령에 대한 통치권을 계승하였다.
바투의 영토는 이르티쉬의 서쪽인 세미팔라틴스크, 악몰린스크, 투르가이 또는 약튜빈스크, 우랄스크, 아다지, 호레즘 본토(히바)를 포함하였고, 또한 킵착인들의 땅부터 볼가 강 서쪽의 정복지인 제베와 수베에테이의 원정으로 얻은 땅을 포함하였다.
1227년 8월 18일 칭기스 칸이 죽은 뒤, 혈통 문제가 불거져 나와 바투와 다른 칭기스 칸의 손자들 간의 알력다툼으로 나타난다. 우구데이는 쥬치의 혈통 문제를 거론하며 바투를 모욕한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사촌들에게 모욕을 당한 바투는 킵차크 한국을 건설하고 몽골 본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끊어버린다.
몽골 전승에 의하면 현명하고 온화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훌륭한 임금'이라는 별명이 주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에게는 무자비한 정복자로 알려져 있다.
1237년에 바투 칸이 러시아의 도시 쿠르스크, 벨고로드, 랴잔 등을 파괴했고 1238년에는 러시아 노브고로드 주의 크레스테츠키 군 을 침략했다.
1241년 킵차크 칸국의 바투 칸이 사조강 전투에서 헝가리의 벨라 4세를 무찔렀다.
그는 칭기즈 칸 가문의 장로로서 제국의 대칸을 둘러싼 권력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대칸 옹립자'도 알려져 있다.
1241년에 우구데이가 죽자 대칸의 자리를 두고 우구데이의 아들인 구유크와 킵차크 한국의 바투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1246년, 구유크는 바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릴타이를 소집하여 칸위에 올랐다.
구유크의 즉위 이후 구유크와 바투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어 재위 3년째인 1248년에는 전쟁 직전까지 치닫았지만 구유크의 사망으로 무산됐다. 구유크가 사망한 이후 바투는 톨루이 계의 소르칵타니와 손을 잡고 우구데이계간의 분쟁이 다시 발생하게 됐다.
1251년에 툴루이의 장남인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톨루이 계의 몽케를 칸위에 올렸다.
바투와 그의 아들 사르타크가 죽었을 때 바투의 형제 베르케가 킵차크 한국을 계승하였다. 베르케는 몽골의 그의 사촌들과 통합하려하지 않았으며 훌라구 칸과는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베르케는 중국을 그의 이론적인 상부로 공식적으로 인식하였다. 사실 베르케는 그때까지 독립적인 군주였다. 다행스럽게도 베르케는 유럽을 공략하는 데 바투와 이해를 공유하지 않았다.
바투는 적어도 두 아이가 있었는데 사르타크 칸과 토코칸이였다.
백장 한국
백장 한국(白帳汗國)은 몽골 제국의 여러 한국 중의 하나였다. 백장한국은 킵차크 한국에 속하였다. 백장 한국은 칭기스 칸 사후 몽골 제국의 분할 후 1226년 건국되었다. 백장 한국은 킵차크 한국의 서부로 동부는 청장 한국이었다.
첫 칸 오르다는 쥬치의 장남이었다. 백장 한국의 수도는 발카슈 호에 있었으나 후에 카자흐스탄의 시르다리야 강변의 시그나크로 옮겼다.
백장한국의 역대 칸
- 오르다 칸(1226년~1280년)
- 코추 (1280년~1302년)
- 부얀 (1302년~1309년)
- 사시부카 (1309년~1315년)
- 일바산 (1315년~1320년)
- 무바락 크와자(Mubarak Khwaja) (1320년~1344년)
- 침타이(Chimtay) (1344년~1374년)
- 우루스 (1374년~1376년)
- 테무르 말리크 (1377년)
- 토흐타미시 (1377년~1378년)
오르다 칸( c. 1204-1280 A.D.)은 몽골의 군사전략가이자 칸(재위:1226~1280)이었다.
오르다 이첸은 백장 한국을 창건하였다. 그는 쥬치의 장남이었고 징기스칸의 장손이었다. 그의 부친의 사후에 그는 동부 영역을 상속받았고 발하슈 호에서 볼가 강까지였다. 이곳에서 그는 결국 백장 한국(아크 오르다)을 세웠다. 볼가 강의 서쪽은 바투 칸의 땅이었다. 그는 청장한국의 첫 군주가 되었다.
청장 한국
청장 한국(淸帳汗國)은 몽골 제국의 여러 한국 중의 하나였다. 청장 한국은 킵차크 한국에 속하였다.
청장 한국은 징기스 칸 사후 제국의 분할 후 1226년 건국되었다. 청장 한국은 킵차크 한국의 동부로 서부는 백장 한국이었다. 첫 칸 바투는 쥬치의 아들이었다. 청장 한국의 칸은 대체로 킵차크 한국의 칸이 겸임하였다.
역대 칸 목록
쥬치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에게 나누어준 청장 한국(淸帳汗國)의 칸은 다음과 같다.
청장 한국(淸帳汗國)의 칸은 다음과 같다.
- 바투 칸 (1242년~1255년)
- 사르타크(Sartaq) (1255년~1256년)
- 울라크치(Ulaghchi) (1257년)
- 베르케 (1257년~1266년)
- 멩구티무르 (1266년~1282년)
- 노가이 칸 (1282년~1299년)
- 토흐타 (1291년~1312년), 1299년까지는 노가이 칸이 실제적인 통치자였다.
- 우즈베크 칸 (1312년~1341년)
- 티니베크 (1341년~1342년)
- 자니베크 (1342년~1357년)
- 베르디베크 (1357년~1359년)
- 마마이 칸 (1362년~1379년)
- 우루스 (1376년~1378년), 우루스는 또한 백장 한국의 칸이며, 토흐타미시의 할아버지이다.
사르타크(Sartaq, ? ~ 1256년)는 몽골 제국의 킵차크 한국의 제2대 칸(재위 : 1255년 ~ 1256년)이다.
1241년 알렉산더 네브스키는 사라이로 와서 사르타크와 사귀었다. 그는 사르타크의 안다 그리고 바투 칸의 양자가 되었다. 알렉산더는 킵차그 한국의 가신으로 블라디미르의 대공이 되는 면허를 받았다.
사르타크는 기도교도가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미신을 믿었다. 사르타크의 개종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 아르메니아 작가는 예를 들어 사르타크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키워졌으며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르타크가 교황 이노선트 4세에 전해진 1254년 8월 29일의 메시지에 의하면 사르타크는 당시에 대공으로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았다. 교황은 그 뉴스를 칸이 보낸 사절이 된 사제에게서 들었다.
킵차크 한국의 칸으로서의 그의 치세는 단명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지 1년 후인 1256년에 죽었다. 아마도 독살되었다. 사르타크는 베르케에 의해 계승되기 전에 잠시 울라크치에 의해 계승되었다. 울라크치가 그이 형제였는지 아들이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사르타크의 딸 테오도라는 벨루제로와 로스토브의 글레브 바실코비치의 아내였다. 그는 로스토브의 콘스탄틴의 손자였고 알렉산더 네브스키에 의해 한때 숙청된 첫 조카였다. 그들의 후손은 러시아의 이반 4세와 러시아 귀족의 수많은 가족을 포함한다.
베르케 칸(Берке) (재위:1257-1266) 은 킵차크 한국의 3대 칸이었다. 베르케는 쥬치의 아들 중의 하나였다. 1246년 베르케는 그의 형제 오르다,신쿠르, 시반등과 바투의 지휘 아래에 참여하였다.
몽골군은 1260년의 아인잘루트 전투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제1차 홈스의 전투에서 또다시 패했고, 시리아로부터 완벽하게 추방되었다.
내부에서 벌어진 분란은 훌라구 칸으로 하여금 아인 잘루트의 치명적인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서 맘루크에 대하여 자신의 전군을 동원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러시아에 있는 킵차크 칸국의 칸 베르케 칸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그의 사촌이 이슬람의 정신적 맹주인 아바스 칼리프를 파괴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보았다. 무슬림 역사가 라시드 앗 딘은 베르케가 바그다드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몽케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당시 베르케는 몽케가 중국에서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무슬림의 모든 도시들을 약탈하고 칼리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나는 그가 너무 많은 고귀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불렀습니다." 맘루크는 무슬림이며, 그의 사촌과 친하지 않은 베르케라는 스파이를 통해 정보를 얻음으로써, 신중하게 그들의 나라를 훌라구와 그의 칸국으로부터 보호했다.
쿠빌라이를 최후의 대칸으로 선정함으로써, 몽골의 왕위 계승이 최종적으로 끝난 후, 훌라구는 1262년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아인 잘루트에서 복수를 하기 위해 맘루크를 공격했다.
훌라구의 중동 원정이 끝난 뒤, 훌라구가 중동 원정 과정에서 행한 이슬람 교도 학살이 문제가 되어 이슬람교로 개종한 킵차크 한국의 칸 베르케와 훌라구 간에 베르케-훌라구 전쟁(Berke-Hulagu War)이라고 불리는 전면전이 발발했다.
베르케 칸은 홀라구에 대항하여 성지에서 북방에 이르는 그의 영지에 대하여 급습을 시작했다. 훌라구는 1263년 카프카스 산맥의 북부 침략을 시도했다가, 몇번의 패배를 겪게 되었다. 이는 몽골인들간의 최초의 내전이었고, 통합된 제국의 최후를 알리는 상징이었다. 이 전쟁은 이후 몽골 제국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1263년 쿠빌라이를 지지하였던 알루구의 공격을 받은 아리크 부케 파 카이두는 킵차크 칸국의 베르케의 지원을 받아 차가타이 칸국의 영토로 침입하여 알루구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다음 번 전투에서 반격을 당해 본국으로 철수했다.
한편 몽골 초원에서는 1264년에 아리크 부케가 최종적으로 패하고 쿠빌라이가 유일한 대칸이 됐다.
1266년 베르케는 훌라구의 아들 아바카와 전투중이 사망하였다. 그는 그의 조카 만그 티무르에의해 계승되었다. 마믈룩과의 동맹정책과 일한국의 포함하는 것은 만그 티무르에의해 계속되었다. 많은 사학자들은 훌라구에 대한 베르케의 개입이 바그다드와 같은 운명에서 메카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성지의 나머지를 구하였다고 동의 한다.
만그 티무르(Менгу-Тимур)는 킵차크 한국의 4대 칸(재위: 1266—82)이었다. 그는 토코칸 칸과 불카 우진의 아들로 바투칸의 손자였다. 멩구티무르 칸은 크림 한국을 지배하였다.
1266년 베르케는 훌라구의 아들 아바카와 전투중이 사망하였다. 그는 그의 조카 만그 티무르에의해 계승되었다.
차가타이의 칸이 바락으로 교체되자 카이두는 다시 원정에 나섰다. 카이두는 킵차크 칸국의 만그 티무르의 지원을 받아 차가타이 칸국을 침입하여 시르다라강 근처와 코잔드에서 벌어진 두 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바락은 트란속시아나로 도망친 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약탈하여 군대를 다시 모았다.
바락의 격렬한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자 카이두는 배후의 쿠빌라이가 침입해올 것을 염려해 바락과 강화를 체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강화의 결과 카이두와 만그 티무르가 트란속시아나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으며 카이두는 차가타이 칸국이 소유하고 있던 투르키스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카이두는 강화대로 이 땅을 만그 티무르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영토로 병합시켰다.
강화는 체결되었지만 바락은 이 강화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부하라를 재정복하려 했으며 사마르칸트를 약탈하려고도 했다. 카이두는 바락의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여 바락에게 아바카가 다스리고 있는 일 한국을 공격할 것을 종용했다. 바락은 일 한국을 공격하라는 제의에 쉽게 응하여 일 한국을 공격할 준비에 나섰다. 이에 카이두는 자신의 아들인 차파르가 이끄는 군대를 지원했으며 킵차크 한국 역시 군대를 지원했다. 킵차크 칸국과 카이두의 지원을 받은 바락은 아바카 휘하의 장수인 테구데르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한 뒤 군대를 일으켜 호라산에서 일 칸국의 군대를 격파했다.
하지만 킵차크 칸국과 카이두는 바락의 성공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 때문에 킵차크 한국 군대는 바락 휘하의 장군인 자라일타이(Jalayirtai)와의 언쟁을 구실삼아 군대를 퇴각시켰다. 바락은 자라일타이를 보내 킵차크 한국 군대에 용서를 구하고 복귀할 것을 설득했지만 허사였다. 킵차크 한국의 군대가 떠나자 카이두가 보낸 차파르 역시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본국으로 도망가버렸다.
1282년 그는 목에 생긴 수포로 죽었다. 동생 투다몽케에 의해 계승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 > 생각의 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의 역사 62 (고려-몽골 전쟁) (0) | 2010.04.13 |
|---|---|
| 중국의 역사 61 (몽골 제국 4 : 원나라) (0) | 2010.04.12 |
| 중국의 역사 59 (몽골제국 2 : 제국의 팽창과 분열) (0) | 2010.04.10 |
| 중국의 역사 58 (몽골제국 1 : 개요) (0) | 2010.04.09 |
| 우면산의 4월(산 자와 죽은 자) (0) | 2010.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