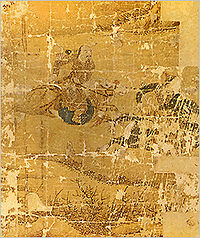향기마을
한국의 역사 238 : 고려의 역사 6 (개요 5) 본문
한국의 역사 238 : 고려의 역사 6 (개요 5)
고려 말의 개혁 정치와 멸망
14세기 후반 원나라의 세력이 약화되자 공민왕은 반원(反元) 운동을 일으켜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다. 공민왕은 원나라를 몰아낸 후 신돈 및 신진 사대부와 함께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그리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나 재산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양민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권문세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권문세족이 다시 등장하여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개혁은 중단되고 말았다. 공민왕 때의 개혁 노력이 실패하자 정치기강이 문란해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 등 고려 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권신(權臣)인 이인임(李仁任)이 10세의 우왕(禑王)을 옹립함으로써(1374년), 권력은 다시 권문세가의 손에 들어갔다. 이인임 일파는 신흥 사대부들을 억압하고 노골적으로 토지겸병을 자행하였다. 반원정책도 수정되어, 원나라와 명나라에 대한 등거리 외교가 추구되었다.
우왕대 초의 최대 현안은 14세기에 들어와 급격히 창궐하게 된 왜구(倭寇)를 격퇴하는 것이었다. 왜구는 도처에서 잔혹하게 노략질을 하여 세곡(稅穀) 수송망인 조운(漕運)까지 마비시킬 정도였다. 고려 조정은 일본 막부에 왜구의 노략질을 근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내란에 처한 바쿠후가 지방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 성과가 없었다. 1377년(우왕 3년)에 최무선(崔茂宣)의 노력으로 화룡도감이 설치되어 화포가 제작되었다. 1380년(우왕 6년)에는 금강 입구에 침구해 온 왜구 5백여 척의 대선단에 화포 공격을 하여, 배를 모두 불태워 퇴로를 차단하였고 내륙으로 침투한 왜구들도 이성계(李成桂) 등의 토벌군이 완전 소탕하였다. 이로써 왜구들은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는데, 1389년( 창왕 원년)에는 박위(朴葳)가 이끄는 고려군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였다.
왜구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인 1388년(우왕 14년) 음력 1월에는 토지 겸병으로 악명 높은 권문세가인 이인임 일당이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 이 숙청은 권문세가 출신이지만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난 최영(崔瑩)이 우왕과 상의하여 집행하였고, 신흥세력인 이성계 장군이 힘을 더하였다. 이로써 권문세가의 기세가 꺾이고 신흥 사대부들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온적인 정책을 추진하던 최영과 적극적인 개혁을 원하는 신흥 사대부 간에는 틈이 있었다.
같은 해에 명나라가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겠다며, 쌍성총관부 지역을 내놓으라고 강압적인 통보를 해오자, 최영은 북으로 밀려난 원나라에 명나라를 협공할 것을 제의하고 명나라의 동북 방면 전진기지인 요동에 대한 정벌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이성계는 군사적 난점을 들어 반대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원정군을 이끌고 출병한 이성계는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위화도(威化島)에 머물면서 지휘권을 장악한 다음 군사를 개경으로 돌려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1388년). 이후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 기도도 중지되었다.
이성계 일파의 집권 후 신흥 사대부들은 권문세가이나 사원이 보유한 농장 등을 몰수하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私田)개혁을 추진하였다. 권문세가들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반발도 적지는 않았다. 폐위된 우왕의 아들 창왕이 이성계 일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나마 왕위를 이을 수 있을 만큼 구세력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성계 일파가 창왕마저 폐위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옹립하자(1389), 정치는 완전히 신흥 사대부가 주도하였다.
또한 사전개혁도 본격화되었다. 전국의 토지에 대한 측량이 시작되어 공양왕 2년(1390)에 완료되자 종래의 공사전적(公私田籍)이 모두 불태워졌다. 사전 개혁으로 국가의 세수(稅收) 대상 토지가 확보됨으로써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관료들에게도 경제적 급부로서 과전(科田)이 지급될 수 있었다. 공양왕 3년 전시과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조지인 과전을 분급하는 과전법(科田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전시과제도 그대로 복구된 것은 아니었으니, 과전법의 수조지 분급 대상지역은 경기지역에 한정되도록 축소되었고, 분급대상도 대체로 현직관리들을 중심으로 한 범위에 제한되었다.
이러한 수조지제도의 대폭적인 축소는 소유권에 의한 토지지배가 확대되고 수조권에 의한 토지지배가 축소·쇠퇴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신흥 사대부들은 정치와 사상 등의 면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며 개혁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역성혁명파(易姓革命派)가 온건한 개량을 주장하는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등의 반대파를 꺾고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함으로써 고려에서 조선(朝鮮)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는 국가사회로서는 연속성을 가졌던 것이었으니, 왕조만이 아닌 기존 국가사회 자체가 멸망하여 영토와 국민이 크게 변동하였던 앞 시대의 삼국에서 신라·발해로의 변화나, 남북국 시대에서 후삼국을 거쳐 고려에 이르는 왕조의 변화와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화는 왕실과 왕조로서는 종말과 새로운 개창이었으나, 영토와 국민으로서는 연속이었으며, 고려 말 당시 국가체제 안에 포괄된 지배층 내에서의 정권교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정권교체의 이면에서는 고려후기 이후 광범한 사회변동 속에서 암중모색되던 개혁이 확고한 방향을 잡고 새로운 체제를 구체화시키는 결실을 보고 있었다.
고려 전기-중기에 벽란도를 개항하여 문호개방 정책을 폈으나, 고려 말기에는 그 의지가 퇴색되어 권문세족의 쇄국주의가 두드러졌다. 모든 정황에서 볼때 조선 뿐 아니라 고려도 쇄국주의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정치
광종(光宗)이 죽자 신라 6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승로(崔承老)였던 것이다.
최승로의 정치 이념은 집권적인 귀족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신라가 항복할 때 고려의 신하가 된 사람으로서 호족과는 달리 지방에 자기의 근거지를 갖고 있지 않은 학자였다. 이것은 자연히 그의 정치적 견해를 집권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또 왕권의 전제화에 반대하고 유교의 정치 이념을 내세웠으니 그가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時務) 28조는 이러한 그의 입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성종은 광종의 개혁이 실패한 뒤의 정치적 수습을 이 유학자들의 견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직(鄕職) 개혁을 실시하여 지방 호족들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한편 호족들은 되도록 중앙귀족으로 흡수하려고 하였으며, 고전과 유교에 밝은 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치에 반영시키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고려 귀족 정치의 터전이 잡혀가고 있었다.
고려는 신라가 귀족인 진골 중심의 정치(성골인 왕족은 수가 적었다 그 증거로는 2명의 여왕이 나왔다.)를 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이성(異姓) 귀족들에 의해 정치를 해 나갔고, 이 이성 귀족들은 자기의 출신지를 중요시하였다. 즉, 본관(本貫)은 호족의 세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었고, 그러므로 문벌(門閥) 또는 가문(家門)이 중요시되었으며, 호적(戶籍)이 평민과 별도로 작성되었다. 호족은 자기 가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혼인정책(婚姻政策)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최고의 귀족인 왕실과의 통혼은 가문으로서의 최고 영예일 뿐만 아니라, 정권 장악의 첩경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왕실의 외척으로서 정권을 추구하는 명문세족(名門世族)들이 나타났다.
안산 김씨(案山金氏)와 인주 이씨(仁州李氏)는 대표적인 존재였다. 안산 김씨는 김은부(金殷傅)가 세 딸을 현종(顯宗)의 비(妃)로 들인 이후 문종(文宗)에 이르는 4대 50여 년간 외척으로서 정권을 차지하였으며, 인주 이씨는 이자연(李子淵)의 세 딸이 문종의 비로 들어간 후부터 안산 김씨를 대신하여 인종 때까지 7대 80여 년간 정권을 잡았다. 그 외에도 최충을 대표적 인물로 하는 해주 최씨도 당대의 명문(名門)이었다.
이리하여 고려는 정치·사회 면에서 귀족 중심의 체제가 이루어졌다. 수도 개경은 귀족의 중심지로서 또는 전국의 심장부로서 발전하였다.
통치 기구
고려는 새로운 통일 왕조로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려의 성립은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역사의 내재적 발전을 의미한다. 또한 외세의 도움 없이 한민족이 단결하여 세운 최초의 진정한 통일 국가였다. 신라 말기의 6두품 출신 지식인과 호족 출신을 중심으로 성립한 고려는 골품 위주의 신라 사회보다 더 개방적이었고, 통치 체제도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효율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사상적으로 유교의 정치 이념을 수용하여 고대적 성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
태조ㆍ광종은 황제를 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의 군주들 또한 스스로를 짐(朕), 수도를 황성(皇城), 군주의 존칭을 폐하(陛下), 차기 보위를 예약한 임금의 장남을 정윤(正胤) 또는 태자(太子), 군주의 어머니는 태후(太后), 군주의 명령은 조(詔)와 칙(勅)으로 부르는 등 제국의 제도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13세기 원나라의 내정 간섭 이후, 모든 제도가 격하되었다. 짐(朕)도 고(孤)로, 폐하(陛下)를 전하(殿下)로, 태자(太子)도 세자(世子)로 낮아졌다.
고려 시대는 외적의 침입이 유달리 많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줄기찬 항쟁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12세기 후반 무신들이 일으킨 무신정변은 종전의 문신 귀족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후, 무신 집권기와 원 간섭기를 지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성장한 신진 사대부를 중심으로 성리학이 수용되어 합리적이고 민본적인 정치 이념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 개혁이 진전되었다.
중앙 관제
태조 왕건은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아울러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신라시대의 골품제(骨品制)를 청산하고 왕권(王權)이 확립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나라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왕권이 확립된 성종(成宗)에서 문종(文宗)에 이르는 기간에 당(唐)·송(宋)의 제도를 수입하여 관제를 정비 완성하였다. 임금의 최고 고문(顧問)으로 삼사(三師)와 삼공(三公)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가 최고의 영예직이요, 실무는 보지 않았다. 중앙행정의 최고기관으로는 삼성(三省)·육부가 있었으며, 삼성은 중서(中書), 문하(門下), 상서(尙書)의 세 성(省)이며, 이것은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문하성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사무, 중서성은 조칙(詔勅)에 관한 사무, 상서성은 실지로 국무(國務)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그 밑에 6부가 있었다.
문하성의 장관을 시중(侍中)이라 하고 수상(首相)격이었으며, 중서성의 장관은 중서령(中書令), 상서성의 장관은 상서령(尙書令)이라 하였다. 이 성의 고관을 재신(宰臣)이라 불렀다. 이 중에서 문하성과 중서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합해서 중서문하성이라 불렀다.
상서성의 지휘를 받는 육부는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形部)·예부(禮部)·공부(工部)였다. ① 이부는 관리의 임면과 상작(賞爵), ② 병부는 무관의 임면, 군무의(軍務)·의장(儀仗), 우역(隅驛), ③ 호부는 호구, 부역, 전량(錢糧), ④ 형부는 법령, 소송, 형옥(形獄), ⑤ 예부는 예의, 제사, 조회(朝會), 교빙(交聘), 학교, 과거, ⑥ 공부는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조(營造)를 각각 맡았다.
이 밖에 삼성과 거의 같은 자격을 가진 삼사(三司)가 있어 국가재정을 통일하였다. 또 군국(軍國)의 기밀과 숙위(宿衛)를 맡은 기관을 중추원(中樞院)이라 하고 그 장관을 판원사(判院事)라 하였다. 중추원은 삼성과 더불어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그 고관을 추신(樞臣)이라 했고, 삼성의 고관인 재신과 아울러 재추(宰樞)라 불렀다. 또 이 두 기관을 양부(兩府)라 한다. 특수 기관으로, 국가의 주요한 격식(格式)을 결정하는 식목도감(式目都監), 감찰을 맡은 사헌대(司憲臺), 조명(詔命)을 맡은 한림원, 모든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사관(史觀), 대학으로 국자감(國子監)이 있었다.
보문각(寶文閣)은 경연과 장서를 맡았고, 어서원(御書院)은 왕실도서관이었고, 비서성(秘書省)은 경적(經籍)과 축소(祝疏)를 맡았다. 재주 있는 문신(文臣)을 뽑아 임금을 모시게 한 홍문관(弘文館), 또 조회(朝會)와 의식(儀式)을 맡은 합문(閤門), 제사와 증시(贈諡)를 맡은 태상시(太常寺), 감옥을 맡은 대리시(大理寺), 빈객에 대한 연회와 접대를 맡은 예빈시(禮賓寺), 시장을 단속하는 경시서(京市暑), 왕실과 종친의 족보를 맡은 전중성(殿中省), 왕실의 의약과 질병 치료 등을 맡은 태의감(太醫監), 공로(公路)와 역원(驛院)을 맡은 공역서(供驛暑) 등이 있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 > 생각의 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의 역사 239 : 고려의 역사 7 (개요 6) (0) | 2011.05.14 |
|---|---|
| 우면산의 봄 25 : 개신교와 이슬람의 끝없는 전쟁 3 (0) | 2011.05.13 |
| 사기와 탐욕의 덩어리, 종교집단 (0) | 2011.05.12 |
| 우면산의 봄 24 : 개신교와 이슬람의 끝없는 전쟁 2 (0) | 2011.05.12 |
| 한국의 역사 237 : 고려의 역사 5 (개요 4) (0) | 2011.05.12 |